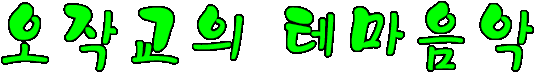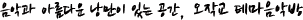클래식 상식 - 클래식 음악의 상식에 관한.....
18세기 작곡가 하이든의 유머는 놀랍습니다. 현대 청중도 깜짝 놀랄 재치를 과시했죠.
바이올린 둘,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를 위해 쓴 현악4중주 ‘농담(the joke, Op.33 No.2)’을 볼까요.
4분여 동안 연주되는 4악장의 마지막 부분. 곡이 끝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한 마디 전체가 쉼표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청중이 박수를 치려는 순간 연주가 천연덕스럽게 계속되죠. 그리고 또 한 번 장난이 이어집니다.
연주자들은 한 마디를 쉬었다 다시 연주하기를 반복합니다.
속다 지친 청중이 박수 치기를 포기할 때쯤 이 곡은 ‘안 끝나는 것처럼’ 끝납니다.
음악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연주자들이 일어나죠. 눈치를 보다 허겁지겁 박수 치는 청중을 보며 작곡가는 웃고 있었을까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문세가 이승철에게 물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곡은 1절만 작곡했다가 2절을 뒤늦게 붙였나 봐요?” 곡이 다 끝난 것 같다가 2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철이 답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그런 아이디어로 작곡된 거예요. 요즘엔 그게 대세래요.”
이 21세기 음악의 작곡자는 혹시 하이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청중과의 ‘박수 게임’이 시대를 관통하는 작곡가의 놀이인 걸까요?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박수 타이밍=청중 수준’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지 오랩니다.
하이든의 ‘농담’처럼 끝난 듯하다 다시 시작하는 음악은 박수를 언제 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문에 가깝습니다. 요즘엔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심지어 무식하단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음악평론가인 버나드 홀랜드는 “현대 청중은 공연장에서 감상자가 아니라 ‘박수 감시자’가 된다”고 비꼬기도 했죠.
초기 음악회는 소수의 제한된 청중 앞에서 사교 모임의 ‘배경 음악’처럼 진행됐습니다.
모차르트는 “귀부인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곡을 작곡했다”는 ‘혹평’을 들었을 정도죠. 그렇게 소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살롱’에서 벗어나 19세기 이후 대형 공연장으로 나오면서 박수에 대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악장 사이는 물론 마지막 음이 사라지기 전 치는 박수도 금지됩니다. 공공의 감상이 기준이 된 거죠. 더 이상 혼자, 혹은 몇 명이 듣는 음악회가 아니니까요.
2008년 12월 무서운 신예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27)의 내한 공연에서 이 원칙이 아주 잘 지켜졌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3분 정도 모든 청중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두다멜은 두 팔을 허공에 든 채 정지해 있었죠.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콘서트홀 구석구석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휘자가 팔을 내리자 그제야 박수가 쏟아졌죠. 모두가 그 마지막 화음을 제대로 즐긴 겁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회장 박수의 원칙이 쉬워지셨나요?
연주자가 박수를 받고 싶어 할 때 주면 됩니다.
- 피아니스트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리고 숨을 돌릴 때,
- 바이올리니스트가 악기를 내릴 때,
- 성악가가 긴장을 풀고 숨을 내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음악에 집중할 수 있고, 남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젠 하이든과의 ‘박수 게임’도 이길 수 있겠죠?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달사마
임동혁의 피아노 연주회에를 다녀왔습니다.
연주하는 피아노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쳐음부터 피아노의 페달을 연달아 밟아 보는 등
조금은 불안한 모습으로 연주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1악장의 연주를 끝낸 연주자가
다시 피아노 페달을 밟아 보느라 약간의 시간이 지체가 되자
'박수'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치니깐 여러 사람들이 따라서 치게 된 것이지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수칠 때 = 청중의 수준"이라고 했는데,
악장간에 박수를 치는 실수를 제법 많은 사람들이 범한 것이지요.
하긴 요즘에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서도 악장간에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소리를 내어서
악장간의 여백(餘白)도 음악적 구성의 일부분인데,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적잖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니......
클래식 연주회 뿐만이 아니라 격식을 갖추어야 할 장소에 나갈 때면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 쯤은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